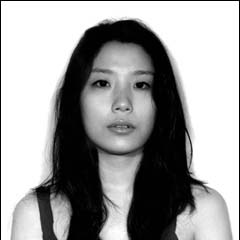첫 이야기는 '그대를 보내는 방법'. 처음부터 쓸쓸한 주제네요. 한 곡 듣고 시작하죠. '클래지콰이'의 보컬로 더 유명한 '호란'의 밴드, '이바디'의 그리움입니다.
호란은 묻습니다. "...사랑한 당신을 어떻게 보내요?", 그대를 보내는 방법을 묻습니다. 또 다른 한 곡을 들어보죠. 'Angel'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Sarah McLachlan'의 'Do what you have to do'입니다.
Sarah McLachlan 역시 말합니다. "I don't know how let you go", "당신을 어떻게 보내야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 땔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듯, 사랑이 죽거나 혹은 사람이 죽거나 사랑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그림자처럼 슬그머니 말이죠.
호란은 "내겐 너무 큰 의미였죠. 마지막 인사도."라는 가사로 이미 이별이 지나갔음을 암시합니다. "Do what you have to do"라는 제목처럼 Sarah McLachlan은 "당신이 해야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별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녀에게 그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I have the sense to recognize"라고, '깨닳을 정도의 눈치는 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호란이 들었던 '마지막 인사'처럼, 먼저 이별의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닐까요?
'Lara Fabian'의 'Broken vow'로 '깨진 맹세'라는 제목부터 이별을 암시합니다. 그녀도 말합니다. "Tell me the words I never said", "내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그 말을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역시 짐작처럼 '안녕'이라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말이겠죠.
하지만 "I'll let you go, I'll let you fly", "그대를 보내주겠어요. 그대를 훨훨 날려 보내주겠어요"라고 말하는 그녀, 그녀는 '그대를 보내는방법', 그 방법을 알고 있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I'd give away my soul to hold once you again and never let this promise end", "그대를 붙잡기 위해 내 영혼을 버고, 이 약속이 결코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외칩니다. 지금은 이별하지만 다시 만날 것이라는 다짐,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나봅니다.
영혼을 버려서라도 붙잡고 싶은 '그대',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길 바라는 '약속', 사랑을 진행 중인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쑥 찾아오는 이별은 또 어찌하나요?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의 일부분과 함께 이 글을 마칩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움'은 '이바디'의 정규앨범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번에 나온 EP 'Songs for Ophelia' 수록곡 중 '오필리어'도 상당히 좋더군요.
*'Sarah McLachlan'은 역시 'Angel'이라는 곡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즈음에 그녀의 앨범 'Surfacing' CD를 구입한 기억이 있습니다. 'Do what you have to do'는 'Angel'가 더불어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나이가 늘어가면서 Angel보다 더 좋아지더군요.
*'Lara Fabian'의 'Broken vow'는 'Josh Groban'이 부른 남성 버전도 있습니다. 가사 역시 남성 버전이구요. 두 곡 다 너무 좋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멋진 가사가 이별을 아름다움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느낌입니다.
<2009년 경에 썼던 글들을 옮겨온 글입니다.>